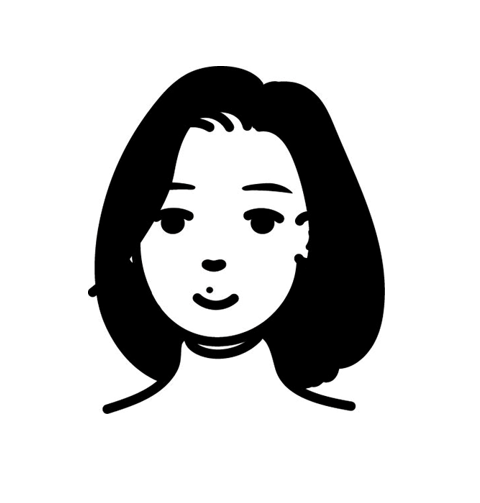<몰아 보고 싶어요?>
글/이일준(정신건강의학 전문의)
feature editor KIM EUN HEE
구독 가능한 OTT (Over The Top : 셋톱박스(Top)를 넘어) 플랫폼이 많아졌다.
넷플릭스는 정기구독으로 보고 있고 티빙은 보고싶은 프로그램이 있을때 월별 결제해서 보곤한다.
사실 나는 드라마를 볼때 매주 다음화를 기다리지 못해 종영이 된 후에 1화부터 시작한다.
즉, 몰아보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몰아 보고 싶어요?' 제목을 보고 글을 안 읽을수가 없었다.
보통 콘텐츠 제공자들은 드라마 방영 시간에 맞춰 일주일에 1-2편씩 콘텐츠를 공개하지만
넷플릭스는 전편을 한번에 공개하는 몰아보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드라마 '모범형사2'를 재밌게 봤는데 티빙에서는 매주 1-2편씩 공개가 되었는데
넷플릭스는 '모범형사2' 종영 후 전편(1화-16화)을 한번에 공개 했다.
이러한 몰아보기 전략에 대해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Reed Hastings)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컨트롤의 자유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자유와 자율을 주는것.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보고 싶은것을 원하는 만큼 볼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넷플릭스의 몰아보기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컨트롤의 자유를 준 것일까?
본문 내용에서 에디터는 질문을 던진다.
영화 <매트릭스1>의 한장면으로 오라클이 주인공 네오에게 "꽃병을 조심해"라고 한다.
깜짝 놀란 네오는 뒤돌아보다 꽃병을 건드려 넘어뜨리게 된다.
그렇다면 꽃병을 깨뜨린 건 네오일까, 오라클일까?
난 당연히 네오라고 생각했다. 네오가 꽃병을 건드려서 넘어뜨린거니까 네오가 꽃병을 깨뜨린거라고 할 수 있지만
오라클의 말에 네오가 놀라서 꽃병을 깨뜨리게 된거이기도 하니까 오라클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즉, 행동은 네오가 했지만, 그 행동에 대한 통제권은 오라클이 쥐고 있었던 것이라고.
넷플릭스로 돌아가서 넷플릭스는 시청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지만 이 선택의 폭이 정말 소비자에게 자유를 준것일까?
넷플릭스를 보느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밤새도록 보느라 잠도 못자고, 그 다음날 일에 지장이 생긴적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여기서 잠을 못자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일에 지장이 생기게 한 건, 즉 몰아 보기 했던 그 행동의 주체는
나일까, 콘텐츠를 제공한 넷플릭스일까?
행동의 주체를 찾을 때 중요한 질문 중 하나로 'Cui Bono Question'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라틴어로 '그것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라는 뜻이다.
현대 사회에는 여가 시간이 점점 느는 만큼 어느 기업이 사람들의 시간을 많이 점유하느냐가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좌우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사 앱에 사람들이 오래 머물도록 애쓴다.
결국 사람들이 돈을 소비하는 시간은 여가 시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몰아 보기 전략은 넷플릭스 안에서 사람들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 이고 그렇다면 이익이 되는 건
당연히 넷플릭스 아닐까?
결론적으로 넷플릭스의 몰아 보기 전략이 시청자들에게 통제력을 준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많은 학자들이 넷플릭스의 몰아 보기 전략이 중독, 과잉, 통제력 부족이라는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는 어떤 전략을 짜면 이용자들이 더 오래 넷플릭스에 머물지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 하려는,
소비자의 중독을 유발하는 집단일 뿐이다.
갖가지의 전략이 치밀해질수록 어쩌면 미래의 우리는 중독을 유발하려는 기업과의 처절한 사투가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다.
기업들이 우리에게 내어준 자유를 진짜 자유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뉴스 기사 및 관심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매일경제] "멀프당했어" (1) | 2022.10.01 |
|---|---|
| [궁금증] 이삿짐 사다리차 훌라후프 용도 (1) | 2022.09.30 |
| [책리뷰] 배움의 발견 by Tara Westover (0) | 2022.09.26 |
| [책리뷰] 노르웨이의 숲 by 무라카미 하루키 (0) | 2022.09.26 |
| [책리뷰] 스토너 by John Williams (0) | 2022.09.26 |